[2024 산인 여행] 겨울밤여행 07
날은 차가운 가운데 맑은 겨울 햇빛이 눈부시게 쏟아져, 간밤에 나보다 잠을 더 설친 짝궁은 눈을 뜨기 버거웠고, 운전대를 바꿔잡았다. 갈 때 오른편에 두었던 호수를 다시 왼편으로 두고 돌아와 숙소를 지나쳐 다이센산 쪽으로.

지난 나흘, 요나고 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매일 보지 않을 수 없던 우뚝 선 다이센산에 드디어 서서히 다가가기 시작했다. 그동안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감이었지만, 다가갈수록 얼마나 높은 산이었는지 그저 감탄, 아니 숙연해질 수 밖에 없었다.
(이 때의 기억 때문에, 그보다 더 크다는 후지산을, 한 번은 직접 보고싶다는 생각이 처음 들었다.)
한 해 전 가을에 갔던 아소산의 높이는 1,592m. 이번 겨울에 맞딱트린 다이센산의 높이는 1,729m. 137m 의 차이인데도 왜 훨씬 더 거대해보였을까. 차가운 겨울이 내려앉아 검고 어두운 옷을 입고 있었기때문일런지.



이번 여행에서 미리 목적지 삼았던 곳의 마지막, 우에다쇼지 사진미술관에 도착했다. 여기까지 왔으나, 정작 10월부터 서울에서 우에다쇼지 사진전시가 열리고 있었다는 것이 좀 웃겼다. 물론 건축물을 좀 더 보고 싶은 것이기도 했지만 ㅎㅎ 돗토리 사구를 중심으로 활동을 한 줄 알았는데, 막상 보니 그것은 일부, 길고 긴 산인을 좌우로 다니며 작품활동을 했던 이었다. 자연이 중심이라기엔 정장을 입은 남자, 우산을 쓴 사람, 쭈그린 아이, 자전거를 타거나 총을 든 소년, 기모노를 입은 여성 등을 한 구도 안에 이리저리 함께 배치해놓은 인물 사진들이 많아서, 농담을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싶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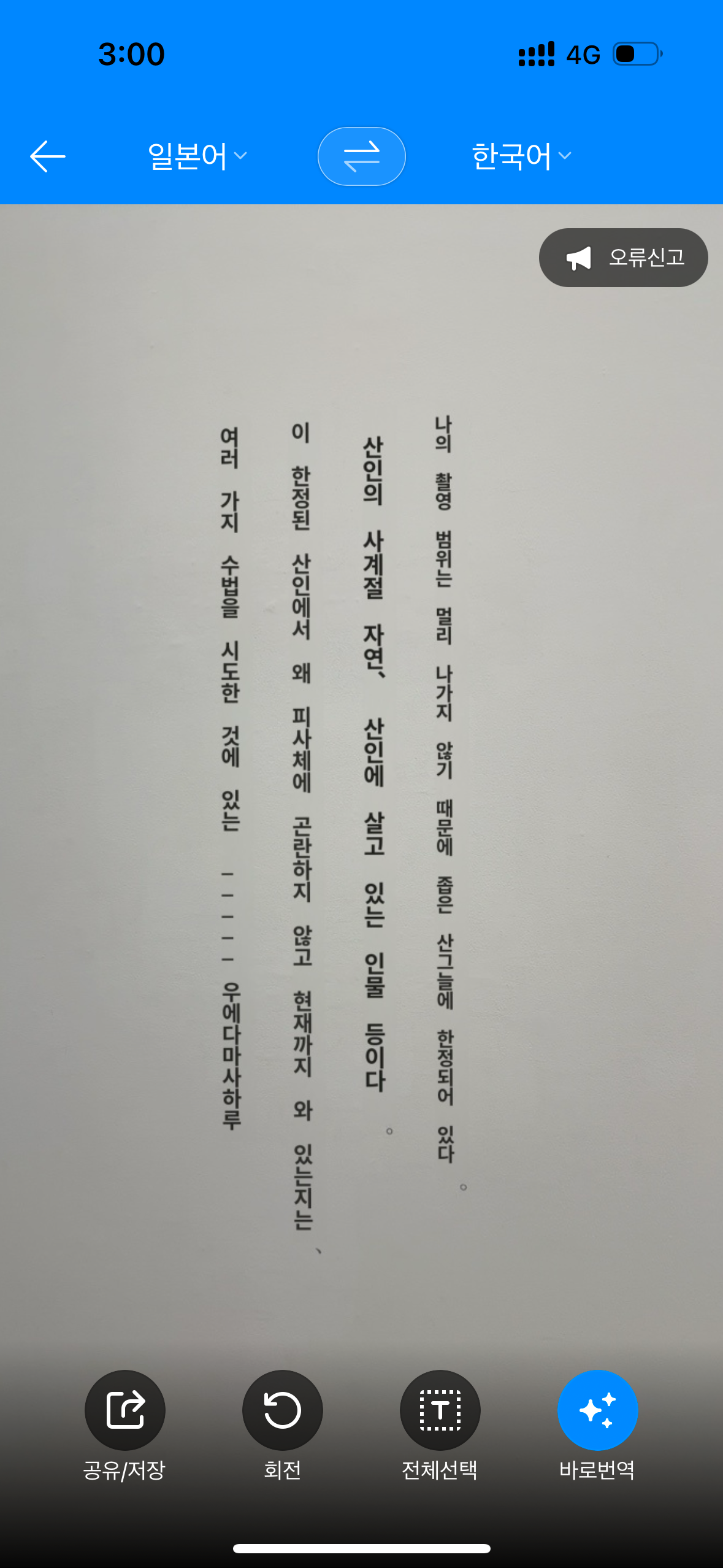
사진보다는 다이센산을 좀 더 감상했다. 서울의 전시는 3월까지 하니 돌아가 이 모든 사태가 일단락 되면 서울의 전시에 한 번 더 가서 사진에 대한 내러티브도 좀 더 읽고, 이 심란한 여행을 애도하는 마음으로 제대로 즐겨보자, 하고 아쉬움을 잠시 나눴다. (하지만 3월 초까지 일단락되지 않았고, 결국 가지 못하거나 않았다.)

계획엔 없었지만, 막상 다이센산을 정면에 두고 달리다보니 좀 더 올라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급하게 다이센 목장의 맵코드를 찍고 산의 한가운데로 달려 안겼다.
아이스크림이 그렇게 맛있다던데, 추운 겨울, 산에 오르니 고도가 높아질 때마다 급격하게 떨어지는 기온에 도저히 아이스크림은 먹을 엄두가 나지 않았다. 다만 내려다보이는 요나고의 경치는 추위에도 발걸음을 떼기 어렵게, 하염없이 바라보게 했다. 모든 심란함과 곤란함을 한순간 지워내고 경탄하게 하는 것은 역시 대자연뿐이다.





해가 지기 전에 조금 더 올라가볼까 짝궁이 제안하여 일단 달리기 시작했는데, 점차 커져가는 다양한 방향의 커브길, 급해져가는 경사에 결국 고소공포증이 있는 나는 좁은 일차선 도로에 멈춰버릴 수 밖에. 짝궁과 운전대를 다시 바꿔잡았다. 와 정말 비쭉 서는 무서움이었다.

본격적인 등산이 시작되는 베이스캠프같은 지역에 도착해서 잠시 전시관을 보았다. 한참 철일 땐 여기의 숙박업소들과 각종 가게들이 붐비려는지. 그 와중에도 고개를 한껏 젖혀야만 보일 듯한 산 정상은 수시로 구름 속에 숨었다가 다시 나타나길 반복했다.
등산브랜드 몽벨이 그럴싸한 기념품 혹은 등산용품 혹은 카페테리아를 운영하고 있어, 친정아부지한테 드릴 티셔츠 선물을 여기서 샀다. 높은 곳을 즐기지 못하는 나는 이런 산에 등산하고자 싶은 욕망이 일생의 단 한 순간도 없었지만, 차갑고 고요한 새벽 아침 이 산의 등반을 시작하는 이들의 기분, 설렘이나 용기는 또 어떠한 것일지, 코끝에 어떤 공기가 가닿을지 조금 궁금해졌다. 전시관에서 보니 대충 여기가 700m 정도 높이. 그럼 남은 것은 1,000m. 차로 올라와도 한참을 올라온 이 700m의 높이보다, 더 길고 높은 구간을 걸어 오르다니, 사실 믿기지 않는다. 그저 헤어질결심의 수완이 되어 "사람이 이런델 왜 올라야해요!" 라고 외마디 외침만 지르게 되는 것이다.
얇은 코트로 들어오는 바람이 이제 견디기 힘들었고, 해가 지기 전 빠르게 산을 내려가야한다는 생각에 오래 있지 못하고 서둘렀다.
다이센산에서 이곳으로 능선을 타고 온 길 말고 바로 내려갈 수 있는 도로가 있어 내려갈 땐 무섭지 않게 내려갔다.

편의점에 들려 저녁 거리를 사서 숙소로 들어왔다. 하루를 다시 길게 보냈고, 어쩐지 큰 산을 등 뒤에 대고 사는 든든함이 부러워졌다. 산을 바라보거나 등지거나, 내가 잠시 등졌어도 여전히 그 품을 벗어날 수 없는 산이 있음에 남몰래 위로를 받았던 하루였다.

